복수주체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한 검토-민사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14 14:36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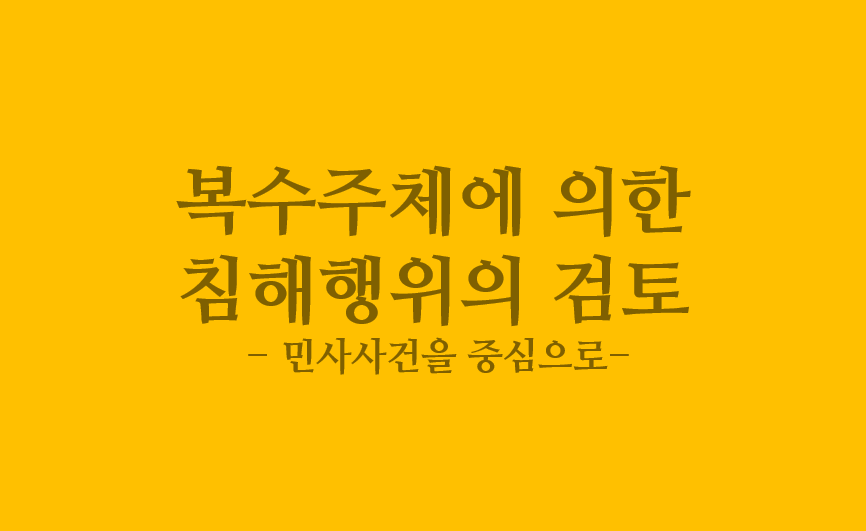
1. 들어가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태양을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미국 CAFC는 BMC 사건 BMC Resources, Inc. v. Paymentech, L.P., 498 F.3d 1373 (Fed. Cir. 2007) 에서 제3자의 방법 단계의 실행을 '지시 내지 통제'(direction or control)하는 실시자는 직접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이후, 2015년 미국 CAFC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Akamai 사건에서는 지시나 지배의 경우에 실시행위의 태양이나 타이밍을 설정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시하여 공동직접침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BM분야의 서비스는 하드웨어 제조자, 통신회사 및 사용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BM발명의 경우 부득이하게 하드웨어, 통신사, 사용자가 모두 포함되는 형태의 청구범위가 작성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각각의 행위를 모두 끌어 모아야 특허청구범위의 실시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자의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수주체가 제품을 제조, 판매 하거나 서비스 하는 경우 복수주체 누구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복수주체에 의한 침해 이론들
가. 직접침해형
특허침해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직접침해형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여러 주체가 나누어 실시하더라도 단수주체의 실시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침해로 판단하는 이론이다. 저작권 사건에 있어서도 저작권 침해물을 직접 지배 및 통제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침해로 보는 견해가 발전하여 왔다. 직접침해형은 주로 일본에서 발전하여 온 이론으로서 도구이론과 지배관리형이 있다. 도구이론은 어느 일방 주체가 다른 주체와 친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이 다른 일방의 하청으로 행동하는 경우 등 양자 사이에 강한 행위지배성이 존재하는 경우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자의 행위로 보는 견해다. 지배관리론에서 말하는 지배관리는 다른 주체의 행위를 지배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발명의 물건을 지배관리한다는 의미로서, 다른 주체를 도구로 하는 즉, 다른 주체의 행위를 지배하는 도구이론과는 다르다.
나. 공동불법행위형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판결).
민법 제760조 제1항에 규정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간에 통모 또는 의사의 공통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 원인이 있어서 가해자 각자의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573 판결 등 참조).
다. 방조/교사형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하여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해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라. 미국의 유도/기여침해 규정
미국에서는 판례에 의해 직접침해에 대한 전단계의 일정한 행위를 간접침해로 판단해 오다가 특허권 남용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러한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2년 특허법 제271조에서 간접침해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특허법 제271조 (a)가 직접침해에 대한 규정이며, (b)는 유도침해(inducement infringement)에 대한 규정이고, (c)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대한 규정이다.
35 U.S.C. 271 (b) Whoever actively induces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35 U.S.C. 271 (c) Whoever offers to sell or sell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 component of a patented machine, manufacture, combination, or composition, or a material or apparatus for use in practicing a patented process, constituting a material part of the invention, knowing the same to be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an infringement of such patent,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shall be liable as a contributory infringer.
미국에서 유도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유도침해자가 직접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도록 실제로 유도했다는 것,
② 유도침해자의 행위가 실제 침해를 유도할 것을 유도침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③ 직접침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다.
위 규정은 우리나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인 교사, 방조행위와 유사하다.
미국에서 기여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허받은 물건발명의 부품이나 특허받은 방법발명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기구가 당해 특허발명의
① 본질적인 부분이어야 하고,
② 그러한 부품 등이 직접침해에만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부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③ 그러한 부품등이 적법한 사용에도 적합한 ‘통상적인 물건’(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여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중요한 부품으로서 상당한 비침해 용도를 가진 기초상품이 아니고, 직접침해에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미국 내에서 판매 또는 공급한 것이어야 한다(DSU MedicalCorp. v. JMSC ompany, Ltd. 471 F.3d 1293 (Fed .Cir .2006)).
미국은 기여침해와 직접침해와의 관계에 대하여 종속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Aro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소비자가 권원있는 직접실시행위를 하였다면 특허권자에 대하여 직접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소비자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행위 역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소비자가 권원없이 실시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직접침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를 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간접침해가 성립하게 된다(김동희, 특허간접침해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63면).
마. 일본의 간접침해규정
일본의 구법(大正10年法)에서는 간접침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다가 민법 제719조의 공동불법행위의 문제로 다루어 오다가 1959년 특허법에서 간접침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본의 1959년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은 미국이나 영국 또는 독일의 간접침해와 달리 직접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그 적용범위를 객관적인 행위태양만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일본 특허법 제101조
1호.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업으로서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호.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 이용되는 물건(일본 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고 그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관하여,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 및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서 그 생산,양도 등이나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3호.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업으로서 양도 등 또는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4호.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업으로서 그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5호.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그 방법의 사용에 이용되는 물건(일본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고 그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관하여,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 및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서 그 생산, 양도 등이나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6호. 특허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업으로서 양도 등 또는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1959년 법과 같이 “~에만”이라는 전용성 요건을 둘 경우 프로그램관련 발명에 대해서는 간접침해에 의한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2년 개정에서 제2호 및 제5호의 행위태양을 신설하였다. 2006년 개정법에서는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양도 등의 전단계인 소지행위를 양도 등의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침해로 보기 위하여 제3호 및 제6호를 신설하였다.
3. 사례
가. 특허권 침해
1) 직접침해형
- 일본동경지방재판소 2007. 12. 14. 선고 2004년() 제25576호 판결
안경테 사건에서 발주측(안경점) 컴퓨터 및 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제조측(피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안경테의 3차원 데이터를 부여함으로써 안경테의 정확한 형상데이터를 제조측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발명으로서 이 경우의 구성요소의 충족은 2인 이상의 주체의 관여를 전제로 하여 행위자로 예정되고 있는 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하였는지, 각 시스템의 일부를 보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실제로 행위를 한 자의 일부가 제조측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는 점은 구성요건 충족문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일본동경지재 平成13(2001)年9月20日 平12(ワ)20503号
피고가 시계문자판용 전착화상을 제조하여 이를 문자판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제품은 공정11에서 뒷면으로부터 전주층을 벗겨내고, 그 다음 박리지(剝離紙)를 첨부한 후, 제품 전주층을 절단하여 분리한 후에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피고제품은 이러한 상태에서 문자판 제조업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바, 이를 구입한 문자판제조업자에 의해 뒷면의 박리지를 벗겨내고, 문자판 등의 피착물에 첨부되는 것은 ‘시계문자판 등 전착화상’이라는 점은 피고 제품의 상품의 성질 및 피고제품의 구조에 비추어 명백하다. 피고제품은 다른 용도는 고려되지 않고, 이를 구입한 문자판제조업자에게 있어서 위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피고제품의 제조시점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제품의 시계문자판 등으로의 첨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전체 공정이 피고 스스로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시되어,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평가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소위 도구이론을 채용한 사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3. 2. 10. 선고 2001나42518 판결
피고가 CD에 담길 노래·연주 등 음원이 담긴 마스터테이프 등을 음반제작업체들에게 건네주면서 CD제작에 필요한 스탬퍼의 제작을 도급주어 음반제작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하는 등 CD제작과정 중 2 내지 4단계 과정의 작업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스탬퍼를 공급받아 그 스탬퍼를 사용하여 CD를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피고가 사용한 스탬퍼는, 오로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은 CD를 생산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하는 수량만큼만 제작되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인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반제작업체들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스탬퍼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이를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1220판결, 2018나1237(병합) 판결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에 의하면 물건 발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개별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전체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공‧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등). 한편, 복수의 개별 물건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건 발명의 경우 그 구성요소인 개별 물건을 모두 만들어낸 것만으로 바로 발명의 대상인 전체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발명에서 이들 개별 물건이 추가적으로 가공, 조립 또는 결합되는 것까지 기술 구성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또한 이들 개별 물건이 단일 주체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체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생산과정 없이도 그 발명의 기술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 발명의 대상인 전체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단일 주체가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단일 주체가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주체가 결여된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주체 모두의 행위가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수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각각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 즉 서로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를 가지고, 전체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또는 서로 나누어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들 복수 주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체로 보아 복수 주체가 실시한 구성요소 전부를 기준으로 당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복수 주체 중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단독으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위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의 제작을 피고 H에게 의뢰하였고, 피고 H로부터 위 각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 D 또는 그 직원들, 형제들의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O 병원에 직접 납품하거나 싱가포르의 Z를 경유하여 O 병원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C은 위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피고 D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인 지위에서도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H는 당초 의료용 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스킨라이프를 운영하던자임에도 피고 C과 함께 위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로 하여 새로운 업체(T)를 설립하였고, 위 각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여러 생산업자들을 물색하여 그 제작을 의뢰하였으며(갑 제6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는 자신의 본래 업체와 관련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 E에 생산을 의뢰한 페이스 업 캐뉼러와 스타터[Starter(Wire&Punch)]에 피고 C, 피고 D, 피고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킨라이프 또는 T도 아닌 “WOOIL MEDI”라는 불상의 상호를 그 제조자로 표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피고 D에 T명의로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H는 피고 C과 공동의 의사 아래 유기적으로 분담하여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D는 피고 E, H 등이 제작한 위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을 납품받아 그 명의로 O 병원에 직접 납품하거나 싱가포르의 Z를 경유하여 O 병원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는바, 피고 C이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위 각 제품의 제작을 지배‧관리하고 이를 수출함으로써 영업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 D는 위 각 제품을 단독으로 생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D는 단독으로, 피고 C, H는 공동으로 가.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위 각 제품이 원고의 제3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각 하나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와 같이 생산된 각 제품을 통틀어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
2) 간접침해형
- 일본동경지방재판소 平成14年(ワ)第6035号
프린트기판용 치구 사건에서는 피고의 클립 제품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트기판도금용 치구’발명에 대한 간접침해가 문제되었는데,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의 의미에 대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와는 다른 개념이고, 당해 발명의 구성요소 이외의 물건이더라도 물건의 생산이나 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도구, 원료 등도 포함할 수 있지만, 한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이더라도 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는 무관계한 종래부터 필요로 되어 온 것은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프린트기판 자체는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 부터 프린트기판용 도금 치구에 사용되어 온 점과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을 고려하면, 특허발명에서 클립 자체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명이 새로이 개시하는 특징적 기술수단에 관하여 해당 수단을 특징부로 하는 특유의 구성을 직접 초래하는 부재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 제품은 특허발명의 클립과 다른 형상이고, 피고 제품을 가공하여 특허발명의 클립을 제조할 수 있는 형상도 아니다”고 하면서, 피고의 클립 제품이 특허발명인 프린트기판 도금용 치구에서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침해를 부정하였다.
- 일본동경지방재판소 昭和54年2月16日 1981.2.25. 선고 특허권침해금지등 사건 판결
원고는 카메라 본체에 자동 프리셋 조리개식 1안(一眼) 리플렉스 카메라(reflex camera)에 대한 원고이며, 피고는 그 카메라 본체에 장착될 수 있는 교환렌즈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그 교환렌즈는 특허제품만이 아니라 비특허제품에도 장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특허법 제101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특허발명에 관련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의미는 위 규정의 적용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대상물이 특허발명에 관계된 물건의 생산에 사용하는 이외의 용도를 갖는 때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물건에 관하여 특정의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추상적 내지 시험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고, 관계 가능성만 있으면, 위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하면 위 규정이 설치된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위 ‘이외의 용도’는 추상적 내지 시험적인 사용의 가능성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이라고 인정된 용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용도’의 입증책임에 대하여는 특허권자가 그 용도가 사회통념상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제품이 비특허제품의 카메라 본체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용도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하여 간접침해를 부정하였다.
3) 공동불법행위형
일본에서는 폴리스티롤 등의 열가소성 물질을 재료로 하여 다공성형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복수 주체가 나누어 실시한 사건에서, 방론으로서 다수주체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특허법원, 특허법원 대원 20주년 기념 논문집, 2018, 595면).
나 상표권 침해
1) 공동불법행위형
-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부정)
오픈마켓 운영자인 채무자가 판매회원약관에서 판매회원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서 상표권 침해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부정판매자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권리침해신고제도, 상표보호프로그램(Brand Protection Program, BPP)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판매자관리프로그램(Gmarket Sales Manager, GSM)상 경고 또는 계도공지문 게시, 이상거래 블랙리스트에 대한 상시감시(모니터링)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별적·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판매정보를 직접 게시한 판매자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채권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부정)
피고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한 절화장미의 일종인 Red Sandra, Kardinal, Frisco, Calibra, Nicole의 장미의 명칭을 상품과 함께 무단으로 전시하거나 전광판에 이를 표기한 사안에서, 피고는 생산업자인 재배농민들로부터 그들이 출하한 장미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아 경매를 통하여 이를 중도매인들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어서 생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들과 사이에 객관적인 공동업무 또는 관련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생산업자 및 중도매인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생산업자 및 중도매인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방조형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그랜드 백화점에서는 백화점과 계약을 하고 입점한 업주측에서 직원과 제품을 모두 책임지고 판매하는 특정매장의 경우 그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상품관리과(검품과)에서 상품의 수량과 품질을 검사한 후 태그(그랜드 백화점이라는 상호와 가격 및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것)를 부착하여 전시·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매장의 입점업체가 많은 양의 제품을 일시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에서 백화점 태그를 미리 제품에 부착하여 검품과에서 표본검사의 형태로 검품을 받아 납품을 하거나 입점업체의 판매사원이 태그를 부착하기도 하여 특정매장의 상품에 관하여는 입점업체에 의하여 주로 상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백화점 잡화부 소속 직원의 경우 바이어(주임, 계장, 대리의 직급)가 특정매장에 대한 입점계약의 체결, 매장관리, 고객관리, 상품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특정매장의 경우에도 검품과정을 거쳐 상품이 매장에 나온 후에는 백화점 잡화부에서도 그 상품관리와 고객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사실, 잡화부 소속 평사원으로 바이어를 보조하는 피고인 2도 수시로 매장에 나가 고객들의 불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계약된 물품이 매장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은 담당 매장을 하루에도 10여 차례씩 순회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1 경영의 특정매장 점포에서 위와 같이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상급자인 바이어 등에게 보고하여 이를 제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1은 위 가짜 상표가 새겨진 혁대 등을 원심 판시와 같이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그랜드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2으로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주인 공동피고인 1이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공동피고인 1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동피고인 1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 1의 판시 각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 1의 판시 각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의무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저작권 침해
1) 직접침해형
일본에서는 캐츠아이 사건에서 음악저작권자에게 공연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 노래방 기기를 재생하여 공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노래방 업주가 음악저작물을 직접 재생한 것은 아니지만, 노래방업주가 공연권을 침해하는 노래방기기를 관리 내지 지배하면서 수익을 위하므로 공연권 침해의 책임진다고 판시한 바 있고(일본최고재판소 1998. 3. 15. 제3소부 판결, 民集 42권 3호 199면), 그 외 자기의 업소에서 악단 등에게 음악의 생연주를 하게 한 카바레 경영자, 자기업소에서 고객에게 음악테이프를 복제하도록 한 음악테이프 더빙점 경영자, 자기업소에서 고객에게 무단으로 복제된 게임소프트웨어를 작동하도록 한 다방경영자, 무용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발레공연을 기획하고 주최한 자에 대해서는 직접침해라고 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관리지배가 없다고 한 판례는 게임소프트웨어의 상영에 필수적인 장치인 컨트롤러를 제조 판매하는 업자는 실제 게임소프트웨어의 상영 행위에 관리 지배가 없고 수신자에게 디지털 신호에 의한 음악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는 수신자의 녹음행위에 관리지배가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2) 방조형
- 비디오메이츠 사건 - 일본최고재판소 2소판 2001. 3. 2. 판결
일본에서는 비디오메이츠 사건에서 노래방 기기의 리스를 영업으로 하는 리스업자가 노래방 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노래방기기를 제공하고 노래방업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저작물이 복제된 CD를 재생하여 수익을 취한 사건에서 리스업자는 노래방업주에게 노래방기기를 인도하기 전에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얻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노래방업자와 음악저작권자 사이에 저작물 이용허락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노래방 기기를 인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리스업자는 공연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한 사건에서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는 그 이용자들이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개인이 야후코리아의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하자 원고가 피고 회사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야후코리아는 복제나 전송권 침해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 회사로서도 저작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이 사건 이미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기술적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 회사가 그 회원의 ‘블로그’에 이 사건 이미지가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방조책임을 부정하였다.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당구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자인 원고가 동영상 시청서비스를 재생하는 피고회사에 무단으로 올려진 동영상을 삭제요청서를 보냈으나, 그 요청서에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동영상이 업로드된 위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하였을 뿐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점, 피고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검색어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갑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 회사가 위 동영상에 관한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을 회사의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다.
글 작성 -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진효 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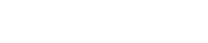
 특허법인 아이더스 공식블로그
특허법인 아이더스 공식블로그 @특허법인아이더스
@특허법인아이더스